2023. 1. 11. 23:19ㆍ개발얘기/graphics
렌더링 엔진을 구현함에 앞서
빛에 대한 이론을 몇가지 공부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내가 시뮬레이션하려는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고 해야 할 것 같다.
나한테 가장 재밌는걸 먼저 포스팅해본다.
오늘의 주제는 빛을 인식하는 인간의 시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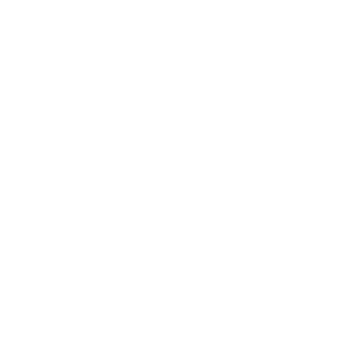

빛은 파장이며 입자이지만, 오늘은 파장으로서의 빛에 주목해본다.
우리는 빛을 다 볼 수 있는게 아니다.
우리는 저 전자기파의 아주 작은 범위만 인식할 수 있다. 그 범위를 가시광선이라 부른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영역은 빨간색의 바깥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영역은 자주색의 바깥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이다.
우리 주변의 불투명한 물체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다.
사과가 빨간 이유는 사과의 표면에 다른 빛은 흡수되고 빨간 색만 반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물질의 표면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한 것으로 세상을 본다.

우리의 눈 망막에는 원추 세포와 간상세포가 있다.
원추세포는 색상을 감지하고 간상세포는 명도를 감지한다. 보통 원추세포는 약 600만개, 간상세포는 약 9000만개 이상으로 우리는 명암을 좀더 세밀하게 감지한다.
원추세포

인간의 원추세포는 각각 청색, 녹색, 적색영역에 민감하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는 인간 기준의 빛의 3원색이 되며(RGB) 이 세가지 세포의 인식을 조합해 색상을 구분한다.
또한 디지털 색상처리에서 이 조합으로 인간이 인식 가능한 거의 모든 색상을 구현 가능하다.
이정도 영역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건 우리가 태양빛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 진화한 결과다.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중 적외선이 49.4%고 가시광선이 42.3%다. 적외선은 대기중에 많은 양이 흡수되거나 산란된다.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는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파장범위의 세기가 가장 높다.
이 대기중의 흡수로 인해 가시광 스펙트럼의 출력 감소는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입사되는 빛은 백색으로 보인다.

곤충이나 새는 이런 종류가 더 다양하게 있어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의 빛을 감지할 수 있다. 반대로 개는 우리보다 원추세포가 적어 흑백으로 세상을 본다.


간상세포
간상세포엔 로돕신이라는 광변환에 수반되는 빛에 민감한 수용체 단백질이 있다. 빛에 극히 민감하여 우리는 저조도 환경에서 시력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 로돕신이 빛에 의해 광분해 된다. 한번에 많은 양의 로돕신이 분해되어 눈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간상세포의 감광성은 감소하게 되고 원추포가 빛을 수용하면서 볼 수 있다.
밝은 빛에서도 간상세포는 작용하지만 다만 그 감광성이 떨어진다.
밝은곳에서 어두운 곳을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캄캄하게 되는데, 이는 로돕신이 밝은 곳에서 분해되어 적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차츰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적어졌던 로돕신이 다시 합성되어 어두운 곳의 빛 조건에서 분해되는 양보다 합성되는 양이 많아져서 감광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어쌔신 크리드, 위쳐같은 실내(특히 동굴)와 실외 맵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 게임에서 이런 현상이 되게 잘 구현된다. (불필요하게)
HDR과 톤 매핑의 도움이다.
예시 상황이 되면 바로 캡쳐 하겠다..
끝을 내기 전에 잠시 다른 생각을 해본다.
나는 고등학생때부터 서양 고전미술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밝힌다.
세상의 유명한 세가지 사과.
아담과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세잔의 사과
현대 미술의 시초. 거장 폴 세잔.
사과의 본질을 그리고 싶다며 사과를 주구장창 그린화가.
솔직히 세잔이 왜 위대한 화가인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못했었다.
사물의 본질을 그리겠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림을 보면, 명암이 없어 사실적이진 않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색칠된거 같고,
원근감, 세밀함도 없다.
나는 그저 느낌대로 현대미술의 시초같긴 하다 라고 느꼈다.

우린 우리 눈에 어느 순간 비친 모습 그 자체가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형상은 그저 우리 인체의 한계대로 물체에 반사된 빛을 눈의 원추세포가 인식한 것일 뿐이다.
사과가 빨간게 아니라 우리가 사과를 빨갛게 본것이다.
세잔은 한 순간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 물체의 본질 자체를 그림으로 담아내고 싶어 했다.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빛을 인식하는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사람마다도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물체의 색과 형태를 결정하는것은 주관적이다. 똑같은 물체에 대해서도 보는 객체가 누구인가, 어디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형상이 달라진다. 그럼 어떤 모습이 진실의 세계일까?
이제 그를 좀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조
위키피디아
https://www.fondriest.com/environmental-measurements/parameters/weather/photosynthetically-active-radiation/https://www.pveducation.org/ko/%ED%83%9C%EC%96%91%EA%B4%91/%EB%8C%80%EA%B8%B0-%ED%9A%A8%EA%B3%BC-atmospheric-effects
http://www.seehint.com/hint.asp?no=11843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5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ecapyo&logNo=90011818984
[1] https://www.benq.com/ko-kr/knowledge-center/knowledge/what-is-accurate-color.html
[2] https://ko.wikipedia.org/wiki/%EC%9B%90%EC%B6%94%EC%84%B8%ED%8F%AC